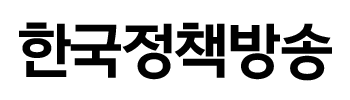|
[한국정책방송=윤영순 기자]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에 있는 운주사에는 ‘영구산운주사(靈龜山雲住寺)’라고 쓰인 일주문을 지나면 그냥 뻘쭉하게 구층석탑이 서있다.
그리고 천왕문이나 사천왕상이 안 보인다. 일반적인 절집의 형식 같은 것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울타리도 문도 따로 없는 천불산 다탑봉 아래 남북으로 뻗은 완만한 골짜기 안에는 탑과 돌부처만이 즐비하다.
흔히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운주사지만, 지금은 석탑 12기와 석불 70여 기만이 남아 있다.
1481년(성종 12)에 처음 편찬되고 1530년(중종 25)에 증보된 <동국여지승람>의 능성현(綾城縣)조에는 “천불산에 있는 운주사에는 절의 좌우 산마루에 석불과 석탑이 각각 1,000개 있고,
또 석실이 있는데 두 석불이 서로 등을 대고 앉아 있다”(雲住寺在千佛山寺之左右山背石佛塔各一千 又有石室二石佛相背而坐)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오랜 망각의세월 동안 천불천탑도 함께 망각의 늪에 빠져 있었다.
입구의 구층석탑에서 골짜기 안쪽의 항아리탑에 이르기까지, 크기도 모양도 다양한 탑들은 골짜기를 따라 줄지어 서 있고, 양쪽 산등성이를 따라서도 드문드문 서 있다.
크고 작고, 서있거나 앉은 불상들은 골짜기 바닥에 있기도 하고 양쪽으로 이어진 바위벽에 기대어 산등성이 곳곳에 흩어져 이끼를 입고 있다. 때로는 머리만 남거나 몸통만 남기도 했으며, 대웅전 뒤편 구석에서 무릎 아래 자잘한 자갈 탑들을 거느리고 있기도 하다.
운주사의 전체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려면 대웅전 뒤편 산 위의 공사바위에 올라야 한다. 마치 사람이 앉았던 것 같은 자국이 파인 이 바윗돌은 그 옛날 천불천탑 불사를 할 때 총감독이 앉아서 내려다보면 골짜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손금처럼 빤히 내려다보며, 지시를 했던 바위라 하여 공사바위라는 이름을 얻었다.
공사바위 아래 암벽에는 마애여래좌상(磨崖如來坐像) 한 기가 새겨져 있다. 이목구비가 비교적 반듯하고 불꽃무늬 광배가 있는 등 어느 정도 불상으로서의 격식도 갖추고 있어서, 어쩌면 좌우 능선과 발아래에 돌부처들을 거느리고 지켜보는 주인공으로도 보인다.
정형화된 형식을 갖춘 석탑이거나 원만하고 위엄이 가득한 불상이 아니라, 대부분 자연적인 바위를 기단으로 삼아 세워진 탑들은 3층, 5층, 7층, 9층 등 층수도 다양하고, 모양도 완전히 정형을 벗어나 원반이나 항아리 모양의 돌을 쌓아올린 것도 있다.
심지어 입구 쪽 오른편 산등성이에는 다듬지 않은 돌덩이를 크기대로 올려놓아 그 모양 때문에 사람들은 이 탑을 양아치탑 또는 거지탑으로도 부른다.
비교적 일반적인 탑에 가까운 사각 지붕돌을 지닌 탑들은 폭이 좁고 몸돌이 높직해서 전체적으로 호리호리하며 지붕돌이 납작하다. 또 이 탑들의 몸돌에는 마름모꼴이나 X, V 등 뜻을 알 수 없는 무늬들이 새김 되어 있고, 네 개의 꽃잎을 가진 꽃무늬가 새겨지기도 했다.
운주사의 집단적인 ‘못난’ 불상들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열망이다. 그들은 높직이 앉아 있는 부처님과는 거리가 멀고 차라리 낮은 땅에 엎드려 간절히 구원을 바라는 중생의 모습이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이, 그들은 비슷비슷한 무표정으로 볕 나면 볕 쬐고 비 오면 비 맞으며 여러 백년을 지내왔다. 그 긴 묵시와 끈질긴 기다림, 그리고 그치지 않은 기원은 오랜 세월의 볕과 비바람에도 결코 풍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렬하게 살아온다.
이 골짜기에 돌부처를 무리로 세워 자신들의 기원을 새겨 넣은 것은 어느 때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기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운주사를 둘러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게 되는 의문이다.
그러나 운주사 유적들은 민중적인 이미지에서 뒷받침을 얻은 것들로, 이곳은 노비와 천민들이 미륵이 도래하는 용화세계를 기원하며 신분해방운동을 일으켰던 일종의 해방구로 추정하고 그들의 염원으로 천불천탑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운주사에는 밤하늘의 별을 지상에 옮겨놓은 것 같은 것이 북두칠성 판박이인 칠성바위와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가리키듯 칠성바위를 따라가면 운주사를 대표하는 누워있는 부처상, 즉 와불을 만날 수 있다.
이 와불(臥佛)에는 ‘와불이 일어서는 날, 천지가 개벽한다.’는 전설이 얽혀있는데, 무엇보다도 운주사의 가장 큰 수수께끼는 수많은 불탑과 불상들을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운주사의 비밀 속에는 와불과 칠성바위에 숨어 있는 것 같다. 칠성바위는 바로 북두칠성이며, 와불(臥佛)은 북극성(北極星)을 가리킨다. 우리 선조들은 하늘의 중심에는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있는 자미원(태을천)이 있고 그 밖으로 28수(宿) 안의 태미원과 28수 밖의 천시원이 있으며, 천문의 분포를 3원, 28수 그리고 300의 성좌(별자리)와 1,460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북두칠성을 신앙하는 칠성신앙(七星信仰)은 고대 이래로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고유 신앙이다. 우리 조상들은 인간의 생로병사, 길흉화복, 불로장생, 부귀영화를 북두칠성(北斗七星)의 칠성님이 주관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의 옛 할머니나 어머니들은 장독대 위에 정안수를 떠 놓고 칠성님에게 소원을 빌어 왔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새벽기도와 사찰의 새벽예불로 발전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우리 조상들은 천지인 합일 사상에 따라 인간은 하늘의 이치에 따라야 인간다운 삶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으며, 하늘은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혼이 돌아갈 고향으로 믿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을 등에 지고 간다고 했다. 옛날 망원경이 없던 시대에도 하늘을 보고 오늘날 봐도 놀랄 만큼 정확한 천문도를 작성하고 그 수많은 별자리와 천체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별자리를 그냥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혜안을 가지고 보았던 것이다.
북두칠성은 고조선 시대, 그리고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는 물론 고려와 조선의 별이었다. 고조선 시대에 만든 고인돌의 뚜껑돌 위에도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다.
특히 고구려 왕릉의 천장 벽화에서는 북두칠성의 형상이 다량으로 발견된다. 광개토대왕을 비롯한 고구려인들은 스스로를 북두칠성의 자손 즉 천손민족으로 적고 있다. 고려시대 고분에도 북두칠성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조선의 옛 땅이었던 중국의 동북부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사찰들은 대부분 대웅전이 있고, 그 뒤로는 칠성각(또는 산신각이나 삼성당)이 대웅전을 호위한다.
불교에서는 ‘선종 계통 사찰에서 석가모니불을 본존불로 모시는 당우(堂宇)’라고 하는데, 중국의 남서지방이나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 불교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대웅전과 칠성각은 옛 조선의 영향권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다.
그래서 대웅전은 불교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우리 민족의 고유 신앙인 신교가 있었다고 한다. 신교(神敎)란 인류 창세 역사 시대의 원형문화이며 유불선 등 현재 지구촌 모든 종교의 모태이다. ‘신교’는 이신설교(以神設敎)의 줄임말로써 ‘신의 가르침을 받아 인간 생활의 중심으로 삼는다.’라는 의미다.
그리고 환웅(桓雄)을 모시던 신전(神殿)이 대웅전이었고, 칠성각이나 삼신당은 이를 호위하는 신들을 모시던 전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가 민중 속에 파고들면서 민중들의 바탕이 되었던 신교나 칠성신앙 등이 자연스럽게 불교와 융합되면서 환웅의 자리에 부처가 차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운주사도 처음부터 불교(佛敎)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당시 우리 민중의 중심 신앙이었던 칠성신앙에서 출발하여 오다가 시나브로 불교에 흡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참고로 1985년에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민속풍경을 촬영하여 유럽에 소개한 요한 힐트만 박사의 운주사의 사진에 의하면 운주사에는 일제강점기 때 건립한 기와집 한 채가 전부였는데, 1990년대에 조계종에서 운주사를 인수하고 석탑과 석불이 산재한 주변의 산과 토지를 매입하여 매년 불사를 일으켜 중건함으로써 지금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의 역사나 유물을 망각할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역사를 함께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정유순 전 전주지방환경청장 전 환경부 한강환경감시대장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저서 <정유순의 세상걷기>, <우리가 버린 봄.여름.가을.겨울> 등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